“많은 부채와 본업과 무관한 M&A, 이마트 주주에 사과해야”
신세계 측 “위기 시에는 강력한 리더십” 항변…쇄신 우선돼야
 |
|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승진하기 전 부회장 신분으로 지난 1월 스타필드 수원의 공사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신세계그룹 |
[CWN 손현석 기자] 최근 신세계그룹이 그룹의 명운을 건 인사를 발표했다. 정용진 부회장의 회장 승진 인사를 낸 것이다. 지난 2006년 부회장 승진 이후 무려 18년 만이다. 이명희 회장은 그룹 총괄회장으로서 총수 지위는 유지하지만 정 회장을 후방에서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의 ‘전면 등판’은 예견됐던 일이긴 하나, 지금까지 그에 걸맞은 경영 능력을 입증했냐에는 물음표가 따른다. ‘공’도 있지만 그에 가려진 ‘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이명희의 신세계그룹이 중요시해왔던 인사 원칙인 ‘신상필벌’ 기준에서도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일 이번 정 회장 승진과 관련해 “승진보다 신음하는 이마트 주주에 대한 사과 및 기업 밸류업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포럼 측은 이마트의 시가총액 2조원 대비 금융부채가 14조원으로 과도하며 미국 와이너리 등 본업과 무관한 딜을 하는 등 무리한 인수·합병(M&A)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와이너리 사업은 평소 와인에 조예가 깊은 정 회장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의 승진에 대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작금의 유통시장을 돌파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통 공룡’으로 거듭난 쿠팡이 앞서가는 데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대공습으로 좁아지는 입지를 반전시킬 대안이라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승진한 배경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같은 또래의 후계자들이 회장으로 승격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그룹 전반에 걸쳐 급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라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이미 신세계그룹의 위기 대응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9월 정기 임원인사에서 계열사 대표이사를 40%나 교체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해당 인사는 당시 정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남매 경영’을 못 미더워한 이 총괄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어진 당시 정 부회장의 주재 아래 진행된 1·2차 전략회의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이끌 컨트롤타워 강화 차원에서 기존 전략실을 경영전략실로, 전략실 산하 지원본부와 재무본부를 각각 경영총괄과 경영지원총괄 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6부터 두 단계 승진으로 부회장 자리에 올라서며 경영 전선에 나섰다. 대표적인 공적으로는 창고형 할인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 도입을 비롯해 간편가정식 피코크 및 자체 브랜드(PB) 노브랜드 론칭 등을 들 수 있다.
트레이더스는 지난 2016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피코크는 2021년 연매출이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했다. 노브랜드 역시 2020년 1분기 이후 꾸준히 연속 흑자를 내며 ‘효자 사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은 과실도 상당하다. 드럭스토어 분스, H&B(헬스&뷰티)스토어 부츠, 주류브랜드 제주소주, 가정간편식 매장 PK피코크, B급 감성의 만물상 잡화점 삐에로쑈핑 등 정 회장이 야심차게 시동을 걸었던 사업들이 실적 부진으로 잇따라 철수한 것이다.
최근에도 정 회장의 반려견 이름을 딴 ‘몰리스’ 사업부, 골프전문점 매장 등이 폐지 및 축소 수순을 밟는 것도 뼈아프다. 또한 한국형 히어로물 탄생을 위해 만든 ‘일렉트로맨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이미 지난해 9월 청산 절차를 밟았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469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인적분할 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됐다. 이에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부진을 손꼽았지만 본업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이마트 별도 기준 총매출은 16조5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9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반면 정 총괄사장이 이끄는 신세계백화점의 지난해 연매출은 2조5570억원, 영업이익은 4399억원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이렇듯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 회장으로서는 파격적인 경영 쇄신을 통한 반전이 다급해 보인다. 또한 소셜 미디어(SNS) 기반의 ‘트렌드 세터’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이미지 제고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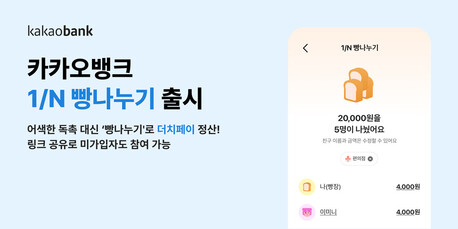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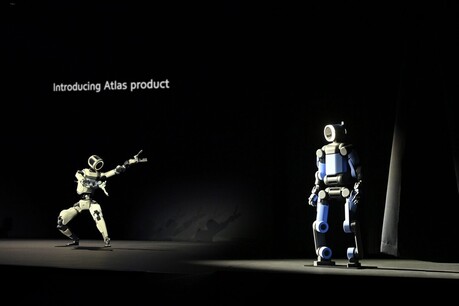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