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전체 은행의 5%인 총 304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 중 200여 개 점포가 사라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을 찾는 금융 소비자가 줄어들고 '디지털,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은행이 오프라인 조직 대상 구조조정에 나선 탓이다.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1인당 생산성 지표에서 단번에 2위로 올라섰다. 1위는 하나은행이며, 카카오뱅크 뒤를 이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이 자리를 잡았다.
당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문한 결과 하반기 감소 폭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대면 영업 조직 축소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마음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폐쇄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형 은행이 대도시 번화가에 점포를 유지하는 비용은 1년에 12억~17억 선이다. 하지만, 비대면 금융이 발전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더는 고객이 지점을 찾지 않아 점포 통폐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은행권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자극받아 더 간편하고 다양해진 기능을 모바일에 추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송금, 조회, 이체는 물론 금융상품의 가입, 해지, 각종 자산관리가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앱 통합 플랫폼을 재공하면서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손 안의 금융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영업점을 줄이며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이나 지점이 적은 지방의 고객 등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 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비대면, 모바일 중심의 금융 산업이 구축되며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 소외 계층을 고려하고, 폐쇄 이후 대체 지점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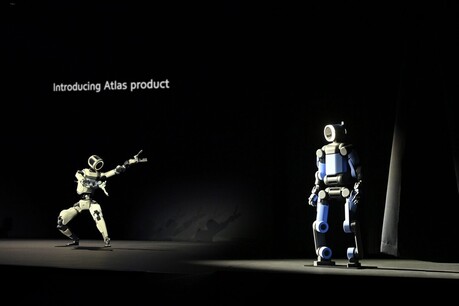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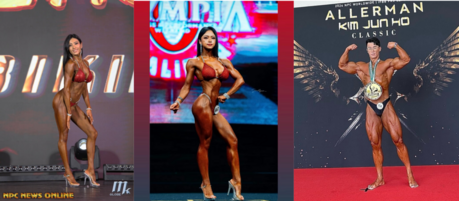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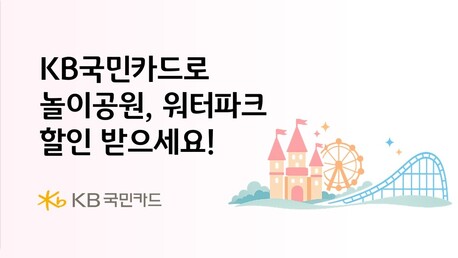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