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황 개선 국면에 발목...HBM,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 지연 우려돼
 |
|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임금 교섭 결렬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소미연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위기를 맞았다.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지난 29일 파업 선언과 함께 집단 연차를 시작으로 단계적 단체행동 돌입 계획을 알렸다. 최종 목표 단계는 총파업이다. 첫 시도인 만큼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향후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 이날부터 전삼노는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 숙박 농성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에겐 내달 7일 연차 소진 지침을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선언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내부에서도 파업에 따른 반도체 사업 타격 정도에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파업 찬성 지지자가 많지 않고, 국내 생산 설비 대부분이 자동화가 돼 있어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지 않을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지만, 생산 지연은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으로 올해 반등의 고삐를 죄려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 것도 부인하지 못했다. 결국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반도체 산업은 제조 특성상 생산라인 작동이 중단될 경우 웨이퍼 폐기 확률이 높다. 한 개의 완성된 칩을 만들기 위해선 2~3개월간 수백 가지의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1초라도 멈추게 될 경우 오염으로 인한 웨이퍼 손상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강진으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도 생산라인에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삼노 조합원 대다수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소속이라는 점은 삼성전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기준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8400명이다.
뿐만 아니다. 생산 차질을 넘어 현재 삼성전자가 공들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고객 주문 맞춤형 사업인 파운드리 특성상 납기일에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 발생 외에 납기일이 미뤄질 경우 신뢰 하락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는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불안 요소다. 31년 연속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신화를 쓴 삼성전자로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문제는 쇄신 경영의 동력 상실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업황 악화로 DS부문에서만 14조88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 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데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TSMC와 점유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위기설'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DS부문장을 전격 교체하며 조직 분위기 쇄신을 통한 추격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데 안팎의 우려가 높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올 1월부터 임금 교섭을 이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삼노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 인상률 3.0%, 성과 인상률 2.1%)를 거부하고 6.5% 인상과 특별성과급 200%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28일 진행된 8차 본교섭도 파행을 맞았다. 전삼노는 사측 교섭위원 2명 배제 요청이 거부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교섭장에 나왔다는데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밝힌 한종희 부회장의 메시지를 통해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모습이다. 당시 한 부회장은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성실하게 소통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할 경우엔 "노동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산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비상경영 닻이 올랐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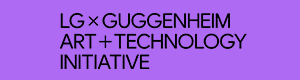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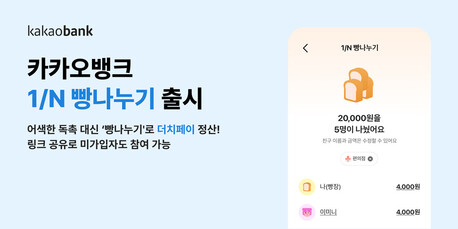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