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버드대 기후과학자 데이비드 키스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스웨덴 국영기업 스웨덴우주코퍼레이션(SSC)의 이스레인지우주센터에서 고도 20km 성층권을 향해 과학실험용 대형 풍선을 띄워 올리는 ‘스코펙스(SCoPEx=Stratospheric Controlled Perturbation Experiment)’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코펙스 프로젝트란?
대기 상층부에 황 입자를 퍼뜨려 햇빛 반사율을 높이면 지구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대형 풍선에 프로펠러와 센서가 탑재된 실험 장비를 매달아 성층권에 올려보낸 뒤 최대 2kg의 미세입자를 방출하는 것이다. 미세입자를 뿌려 길이 1km, 폭 100m의 반사 입자층을 형성한 뒤 빛 반사율의 변화를 살펴보려는 목적이다.
실제 프로젝트에선 이산화항 대신 탄산칼슘을 먼저 실험해보기로 했다. 이산화황이 만드는 황산염이 오존층을 잠식하고, 성층권 온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6월에 과학기술을 이용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 지구공학 실험용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성층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태양 지구공학 종류는?
미국국립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NASEM)가 발표한 `햇빛 반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가지 지구공학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첫 번째는 지구 대기에서 가장 높은 성층권에 미세입자를 뿌리는 것, 두 번째는 선박을 이용해 염수를 저고도 바다 구름에 뿌려 반사율을 높이는 것(클라우드 브라이트닝), 마지막은 고고도 구름을 엷게 만드는 `구름 솎아내기'(클라우드 씨닝)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디어는 햇빛 반사율을 높이는 방안이고, 세 번째 아이디어는 열이 지구 밖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방안이다.
지구공학 실험, 지구 기상 패턴에 악영향 우려
성층권 입자 방출은 지구의 날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국제 공동연구팀은 2016년 인도에 지구공학을 적용할 경우 땅콩 수확량이 20% 감소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피나투보화산 폭발의 지구 냉각 효과도 이듬해 가뭄을 유발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하버드대의 지구공학 연구팀 일원인 프랭크 코이치 교수도 지구공학 실험이 일시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겠지만 더 큰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상 첫 태양 지구공학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구와 인류의 상생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거라 기대한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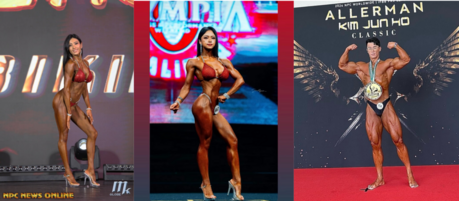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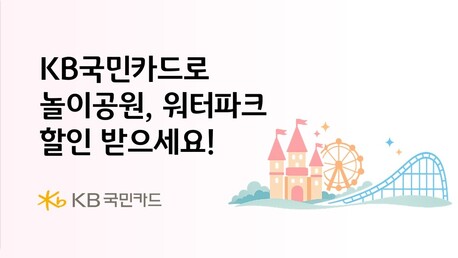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