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었다. 여러 사람의 집합이 금지되면서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서 업무를 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아직 의료 서비스는 대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는 원격 진료가 이미 활성화되어있다. 미국은 1997년부터 부족한 의료기관과 비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 진료를 도입하였고, 대다수 지역에서 원격 진료에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다.
중국은 2014년에 원격 진료를 도입하였으며, 원격 진료 및 처방, 의약품 배송까지 가능한 ‘알리 건강’은 누적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중국의 원격 진료 서비스는 활성화되어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응 단계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중국의 대명절인 춘절 기간에는 하루 최대 600만 명에게까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진단 검사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 추적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과 원격 진료 서비스가 큰 몫을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원격진료를 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제한된 범위의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인프라가 부족해 활발히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인 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전송이 계속해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분야는 매우 민감하므로 더욱 정보 통신에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빅데이터 분야의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지속되는 유행에 따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원격 진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해외의 사례처럼 원격 진료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의 큰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장 또한 흐름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이라 기대되는 바이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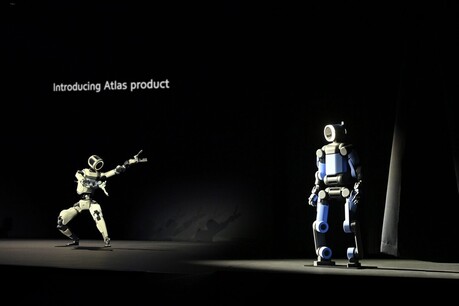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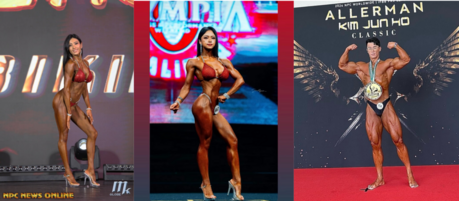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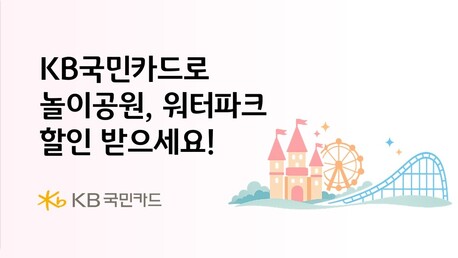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