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차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이름 그대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만약 운행 중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책임일까,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책임일까?
사고 처리 방법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자율주행 1~2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게 처리한다. 1단계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수준, 2단계는 부분적으로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1~2단계는 기술 수준이 낮아, 운전자 책임이 크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운전자의 잘못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특정 도로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인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다면, 운행 책임이 분산되어 사고 발생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
이보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4단계 이후이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5단계는 완전 자동화로, 모든 도로와 교통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 이후부터는 운전자의 책임보다 자율주행 기술의 책임이 커지고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차량이 운행되어 책임이 더욱 분산된다.
그러나 책임의 구분이 모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교통 연구원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우려 사항을 조사한 결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 21.2%로 2위를 차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7년, 자율주행차의 공도로 주행을 허용하기 위해 도로 교통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2018년, 일본은 자율주행차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6년,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위한 제도를 갖추었으며, 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된다면, 편의성이 향상되고 차량 흐름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율주행차의 딥러닝 알고리즘은 도로 상황의 예측과 해석이 불가능하고 오류 감지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책임 규명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1~3단계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2030 미래 차 산업 발전전략에서 2024년에 자율 주행 기술 4단계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책임 규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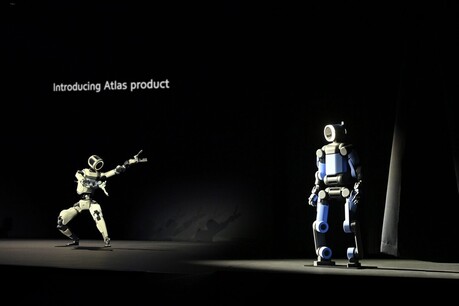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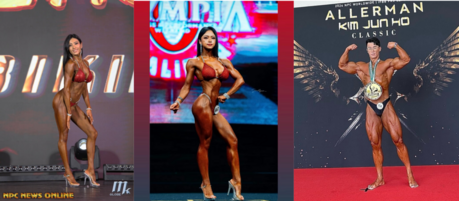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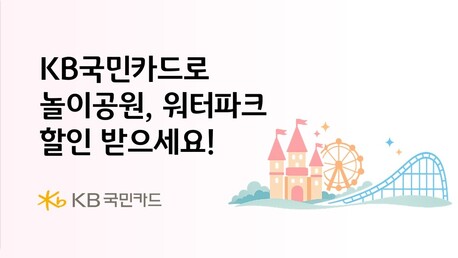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