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업1부 소미연 차장 |
[CWN 소미연 기자] 노동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임금 교섭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노조의 단체행동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모두의 응원이 필요한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를 향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온도차가 컸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다르지 않았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7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전체 인원(약 12만명)의 23%가 넘는 2만8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올해 임금 교섭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무산되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물론 파업 강행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교섭을 재개했고, 오는 28일 본교섭을 앞뒀다. 뒷말은 산 것은 지난 24일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된 단체행동이었다.
전삼노는 MZ세대 직원들과 일반인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 형식을 빌려 단체행동을 준비했지만 도리어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연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뉴진스님(개그맨 윤성호)과 가수 에일리, YB(윤도현밴드) 등 유명 연예인을 초대한 일이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전삼노에서도 이미 예상했다. 행사 당시 관계자는 조합 설립 4년이 지난 사실을 상기시키며 "조합비를 모아서 마련한 자리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합원 수가 많아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다. 합법적 투쟁, 당연한 권리 행사, 문화행사 취지까지 머릿속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감대를 이끌어내긴 다소 어려워 보인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으로 알려진데다 사측에서 제시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 인상률 3.0%, 성과 인상률 2.1%)도 소비자 물가 인상률(2.6%)의 2배 수준이다.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전삼노의 주장은 백번 옳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만 14조8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떼쓰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실제 관련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전삼노 대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많다. '노조를 없애야 한다'는 날선 반응부터 '위기에 놓인 회사부터 살려야 한다'는 독려까지, 삼성전자를 '국민 기업'으로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겼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번 단체행동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강성 노조로 분류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200명이 '질서유지인'으로 참석했다는 점은 또 다른 우려를 샀다. 바로 노조의 정치화다. 기업 입장에선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31년 연속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신화를 쓴 DS부문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을 경쟁사에 내주면서 열세에 놓였다.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컸다. 임직원들의 주 6일제 근무 시행, DS부문장 전격 교체가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HBM 제품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발 보도에 이례적으로 반박성 보도자료를 낸 것도 삼성전자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삼성전자 노사는 28일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전삼노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닌 노조 무력화 시도 철회, 투명한 성과급 지급이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임금인상률 결정을 바로잡고, 성과급 지급 기준은 영업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도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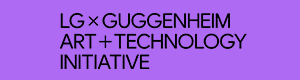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