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충전시설 일명 '집밥'·'회삿밥' 필수
국내에 전기차 판매가 시작된 지 7년차에 접어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60만대의 전기차가 등록됐지만 아직도 '전기차 라이프'는 접근이 쉽지 않다. 구입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부터 전기차로 즐기는 캠핑까지의 과정을 차근 차근 짚어본다.|편집자

[CWN 윤여찬 기자] 전기차 연재 첫 회는 구입과 충전 환경부터 시작한다. 전기차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통상 시단위) 보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딜러들과 상당한 소통이 필요하다. 구매자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중간에서 딜러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국고보조금까지 함께 매칭해 처리해 주는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자체는 구매자에게 문자를 보내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친다.
이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딜러와 함께 환경부 산하 홈페이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실시간으로 남은 보조금 지급 가능 댓수를 확인하는 게 필수다. 하반기 들어선 지자체 보조금이 바닥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몇 대 안 남은 시점부터는 직접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하는 게 좋다.
물론 매년 2월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구매 과정은 시작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수 십 종의 모델에 보조금 액수를 각각 매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하고 3월 초순은 돼야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을 시작하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종료는 매년 11월 중순이면 끝이 난다. 따라서 11월에서 2월까진 보조금이 없는 비수기다. 정확히 말하면 구매는 가능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라 보면 된다.
한번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 보유하거나 동일 지자체 내에서만 중고로 판매할 수 있다. 이전에 되팔게 되면 받았던 보조금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 후 2년이 넘은 중고차가 전국에 많이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 다음으로 중요한 건 충전 환경이다. 전기차는 매일 장거리 주행을 반복하는 운전자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집밥' 또는 '회삿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매일 충전 여건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야 제대로 된 전기차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그것도 충전 요금이 비싼 급속이 아니라 보통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 충전 시설이 필수다.
거주지의 충전 주차구역이 여유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낮이 아니라 저녁부터 야간 시간대에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낮 시간엔 여유있어 보일지 몰라도 전기차는 저녁 퇴근 후부터 충전기를 꽂으면 아침까지 차가 빠질 일이 없다고 봐야 한다. 한번 충전을 시작하면 완속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한데 이를 두고 이웃간 과태료 부과 신고는 흔한 일이 됐다.
아울러 충전을 위해선 다양한 충전 카드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애초부터 마구잡이로 여러 중소 사업자에게 충전소 사업권을 내줬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방전이 될지 몰라 5종 이상의 카드를 갖고 다니는 촌극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티맵이나 카카오맵 등에서 사업자 통합 충전 앱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 만큼의 수수료는 감안해야 한다. 뜻하지 않게 이용하게 되는 급속 충전소 역시 빠르게 인상되는 전기 요금에 놀랄 수 있다.
CWN 윤여찬 기자
mobility@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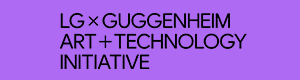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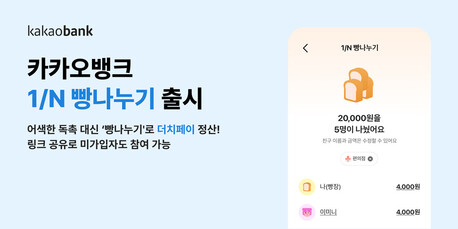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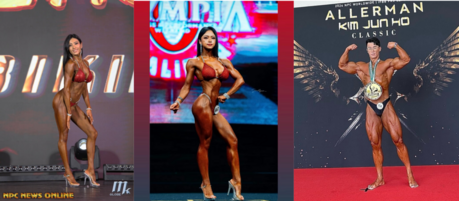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