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치사회부 정수희 기자 |
자치구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며칠 전 구로구의회를 방문했다.
직업상 상대방이 반기지 않는 경우도 때때로 있으니 환영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큰둥한 태도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니 차치하고, 그 자리에 3년 동안 있다는 홍보팀장의 명함을 받아 들고 이거 참 괴이하다 싶었다.
그녀의 직함이 떡하니 '의사팀장'으로 표기된 게 아닌가.
속기사로 입직해 30여 년간 근무해 오다 곧 정년퇴직이라지만 지난 3년간 그녀는 홍보팀장이었을까, 의사팀장이었을까.
함께 자리한 보도 담당 주임은 "명함이 (아예) 없다"고 했다.
"구청에서 파견돼 1년만 있고 그동안 필요성도 못 느꼈다"고 말하는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명함은 비즈니스에서 기본 매너다. 또한 홍보 업무는 조직의 얼굴에 비유되기도 한다.
자신은 물론 소속된 조직을 알리는 데 인색한 그들에게 '홍보'의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대변인실과 홍보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기자의 눈엔 직무유기로 보였다.
만일 부족한 재정 탓이라면 홍보팀장은 명함에 쓰여 있는 소속을 고쳐 쓰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일이 있기 하루 전 용산구의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설명한 뒤 현장 시찰까지 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천진 의장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수장의 의지가 뚜렷해도 일을 성사하는 데는 홍보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용산구의회와 구로구의회에 관한 기자의 관심과 이해도에는 천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는 만큼 보이고 자주 볼수록 마음이 생기는 건 인지상정이니 말이다.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은 알게 모르게 '오피니언 리더'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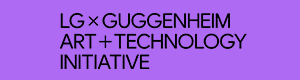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